5월, 여름이 온다. 농부 시절의 기억은 밭과 농장과 함께한다. 쟁기, 괭이, 소달구지 외에도, 한 쌍의 장대와 어깨장대는 농부의 생계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3대, 4대가 함께 사는 "한 지붕 아래 3대", "한 지붕 아래 4대" 가정을 제외하고는 조부모나 부모 세대가 등나무, 대나무 등으로 만든 대나무 장대와 나르기 장대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대나무 장대와 나르기 장대를 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고, 하물며 사용해 볼 기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대나무 장대와 나르기 장대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손수레,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른 물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대나무 장대는 관광 이나 극단, 영화 제작진 등에서만 사용됩니다. 소비 수요가 더 이상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도 예전처럼 소박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 시절에는 마을 밭이나 들판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상품을 필요한 곳까지 운반할 대나무 장대 한 쌍과 운반대 한 개, 바구니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장대 한 쌍과 운반대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돋우는 주제입니다.

어린 시절, 특히 여름 방학 때 아버지는 종종 저를 소달구지 여행을 데리고 숲으로 가서 장작과 목재를 모았습니다.제 주된 일은 소를 치는 것이었습니다.장작을 모으러 간 후, 저는 아버지가 5~7m 길이의 등나무 장대 몇 개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달빛이 비치는 밤이나 여가 시간에 아버지는 집 연못의 물에 적신 등나무 장대를 가져와 길이가 다른 작은 가닥으로 나누고 가족이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대 쌍으로 묶었습니다.아버지는 종종 어른에서 아이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거나 짧은 여러 쌍을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저도 제 장대 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등나무로 만든 한 쌍의 장대는 종종 대나무 바구니 한 쌍과 함께 사용되어 물건을 담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연 철사 코일의 가시를 펜치로 제거하여 장작이나 쌀 등 거칠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위한 쇠막대를 만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쇠막대는 바구니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어깨에 메는 쇠막대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목수가 윤을 낸 나무 막대는 양쪽 끝에 막대를 고정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막대는 어머니나 자매가 작고 가벼운 일상 용품을 나르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젊은이나 어른들이 쌀, 비료, 장작, 농산물 등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막대는 단단하고 짧습니다. 이러한 막대는 대개 대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단단하고 유연한 작은 대나무 마디가 있는 대나무 뿌리를 깎아 길거나 짧은 막대를 만들어 어깨에 걸었을 때 손으로 두 개의 끈을 잡기에 딱 맞는 크기로 만듭니다. 막대의 양쪽 끝은 두 개의 마디로 깎아 막대의 양쪽 끝에 걸 수 있도록 합니다.
1980년대 중학교 시절, 저는 어머니의 뾰족한 두 끝이 달린 나무 나르기 막대기를 자주 사용하여 마을 강이나 개울에서 물통을 떠서 명반으로 코팅된 항아리에 담아 매일 요리하고 씻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나르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아서 물통이 흔들리면서 발을 부딪히거나 물이 튀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투안남 지역의 순수 농업 공동체였는데, 어머니와 누나들은 항상 나르기 막대기와 바구니 두 개를 어깨에 메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고향에는 논이 없어지고, 둑과 논밭은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멘 어머니, 딸, 농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원시적인 도구를 점차 대체하여 사람들은 일상의 노동에 많은 노력과 땀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일하러 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찾는 날마다 어깨에 멘 그 소박하면서도 시적인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달빛 아래 물을 길어 두 개의 양동이에 어깨에 얹어 쉬게 하던 시절, 그리고 장터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장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기다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난과 고난의 시대를 상징했던 두 어깨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광고_2]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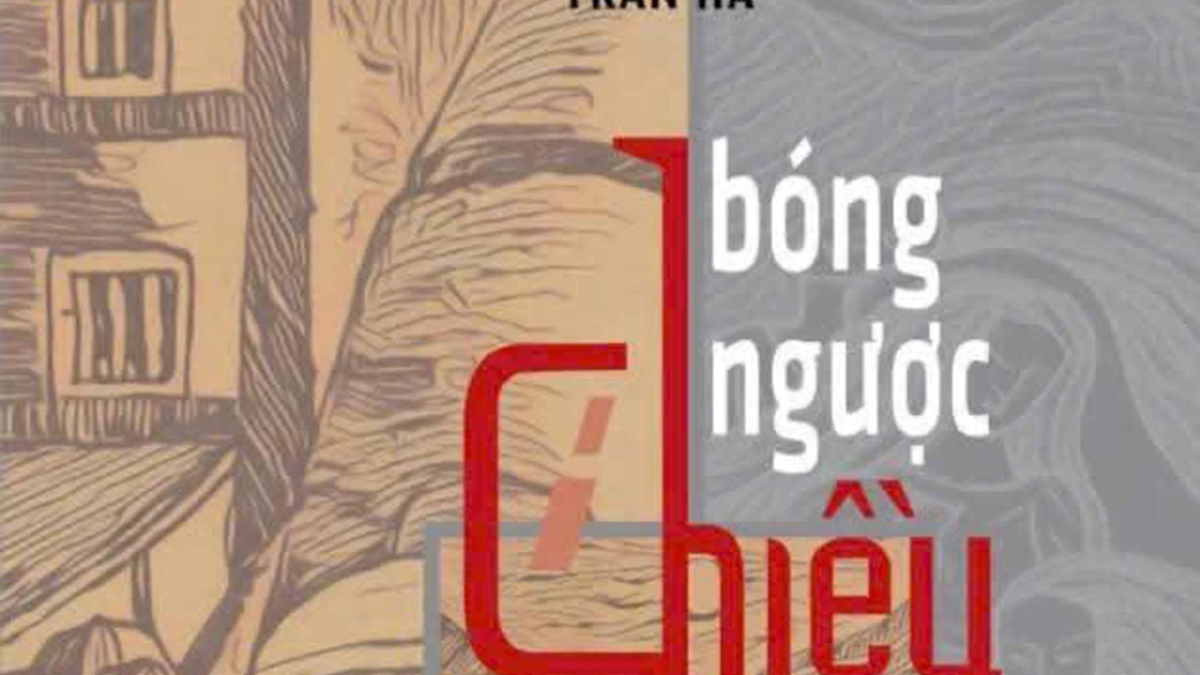






![[영상] 100여개 대학, 2025~2026학년도 등록금 발표](https://vphoto.vietnam.vn/thumb/1200x675/vietnam/resource/IMAGE/2025/7/18/7eacdc721552429494cf919b3a65b4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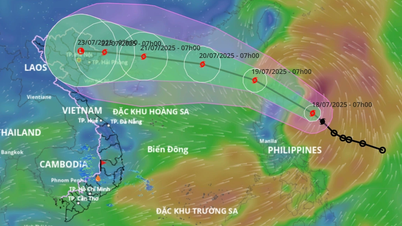



























![[인포그래픽] 2025년에는 47개 제품이 국가 OCOP 달성](https://vphoto.vietnam.vn/thumb/402x226/vietnam/resource/IMAGE/2025/7/16/5d672398b0744db3ab920e05db8e5b7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