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Cu Da)는 깨달음을 얻어 신선이 되었습니다.
꾸다의 본명은 응우옌 반 다(Nguyen Van Da)로, 딘 뜨엉(Dinh Tuong) 구, 투옥 니우(Thuoc Nhieu) 현, 니 빈(Nhi Binh)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술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무술 시험에 합격하여 꾸다(Cu Da)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유명해졌을 때,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남끼(Nam Ky) 전체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에 대항하는 깐 브엉(Can Vuong)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푸 깟(Phu Cat) 마을(구 빈 딘(Binh Dinh))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프랑스군에게 쫓기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피난처를 찾았다가, "영웅이 될 수 없다면 보살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고향을 떠나 탓 선(That Son)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했습니다.

남칸 사원
사진: 황푸옹
그날 다오랍과 그의 제자 후인 반 티엔은 따론 산 정상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갈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오랍이 큰 소리로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산으로 올라갈 길을 찾고 있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손님은 자신을 꾸다라고 소개하며 법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오랍은 "수행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왜 가져가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짐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꾸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수행했습니다.

남중국해의 대천사와 사찰 안뜰에 있는 고대 오행의 상부 동굴
그 이후로 다오랍 선생은 높은 절벽에 살았고, 꾸다 선생은 낮은 절벽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그는 따론(Ta Lon)과 랑티엔(Lang Thien)이라는 두 개의 강연을 썼을 것입니다. 특히 따론 강연은 자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후세 사람들이 읽고 푸꾸옥에서 따론산을 거쳐 장탄(Giang Thanh), 까이더우(Cai Dau), 깜산(Cam Mountain)의 보홍 동굴(Bo Hong Cave)까지 이어지는 그의 여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자신을 바이다(Bay Da)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사원을 주관했던 승려들의 초상화가 있는 조상 제단
" 바이다가 무릎을 꿇고 스승님께 말씀드렸습니다./오늘 제 고향은 투옥뉴입니다./부모님은 이제 버려졌습니다./형제자매도 많아서 여기저기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 (장따론)
꾸다의 종교적인 명칭과 관련하여, 롱호아 신도들은 붓다 관암이 따론산에 나타나 시합을 열었고, 꾸다가 깨달음을 얻어 선녀의 우두머리로 임명되었으며, 붓다께서 그에게 응옥탄이라는 칭호를 하사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탓선 지역 신도들의 "사(四)"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꾸다는 선녀, 도안민후옌은 부처, 후인푸소는 성인, 응우옌쭝쭉은 신입니다.
이상한 기타 두 대
응우옌 반 하우(Nguyen Van Hau) 작가가 저서 『탓손 미 후옌(That Son My Huyen) 』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꾸다(Cu Da) 선생은 한때 깜산(Cam Mountain)에 무술 도장을 열기 위해 갔다고 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그가 옛 제자들을 만나러 탓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입소문에 따르면, 가끔씩 사람들이 흰 머리와 수염을 하고 있지만 젊은 얼굴을 한 노인이 검은 호랑이를 타고 탓손 산의 숲을 오가는 것을 보고 그가 꾸다 선생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피쉬-드래곤 기타
브엉 킴의 저서 『부우 손 끼 흐엉』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투옥 니우에 사는 한 친척이 그를 만나러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산을 오르고 시냇물을 헤치며 지쳐 있던 그는 지치고 낙담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그를 찾아와 꾸다 선생이 불로불사를 얻어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그에게 그 어린 소년이 꾸다 선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린 꾸 류트
남깐 사원은 짜쑤산 입구에 바로 위치해 있지만, 사원의 역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초대 주지가 1902년에 세상을 떠난 후옌띤(Huyen Tinh)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양쪽 달마상 아래 조상 제단에 두 개의 기이한 악기와 일곱 명의 스님 초상화가 놓여 있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어 아마도 이전 주지들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악기는 모노코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양식화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머리와 물고기 꼬리가 새겨져 "킨응우호아롱(kinh ngu hoa long)"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어가 머리를 드는 모습이 새겨져 "린꾸응힌팝(linh cu nghinh phap, 설법을 듣는 악어)"이라고 불렸습니다. 두 악기는 외형뿐만 아니라 현의 개수도 달랐습니다. "킨응우호아롱" 악기는 현이 9개였고, "린꾸응힌팝" 악기는 현이 3개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꾸다(Cu Da)가 따론산(Ta Lon)에서 가져온 흑단으로 이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방식을 통해 형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미래"라는 이미지, "물고기가 용이 된다"라는 이미지, 그리고 남방 불교의 친숙한 민담인 악어가 승려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동시에, 3현과 9현의 현을 통해 독자는 "삼교구류(三敎九流)", 즉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백가(百家)의 9가지 학문과 사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민담에 따르면, 이 두 악기는 살아 계신 부처 꾸다(Cu Da)가 "우주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꾸다 부처가 이 두 악기를 탓썬(That Son) 지역에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꾸우 틴 밧 동, 땀 틴 코이 비엔(cuu thinh bat dong, tam thinh khoi bien)"이라는 구전 설화가 있는데, 이는 9현 악기의 소리가 나면 군대가 움직이지 않고, 3현 악기의 소리가 나면 군대를 조직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두 악기가 탓선(That Son) 지역에 꾸다(Cu Da) 선생이 세운 여러 사찰을 거쳐갔고, 프랑스군에 의해 여러 차례 불탔지만, 이상하게도 두 악기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불타기 이후 사찰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한참 후, 한 승려가 버려진 사찰 부지에 작은 탑을 세웠습니다. 두 악기를 본 승려는 악기를 깨끗이 닦아 본당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남깐 사원 마당 앞에는 옛 사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남하이족의 찬 사이 다이 깐(Chanh Sai Dai Can)과 트엉 동 꼬 히 반 반 응우 한(Thuong Dong Co Hy Van Ban Ngu Hanh)을 모시는 사찰로, 이들이 선종 사원에 거주했던 곳은 아닙니다. ( 계속)
출처: https://thanhnien.vn/that-son-huyen-bi-cay-dan-la-o-chua-nam-can-18525100420052306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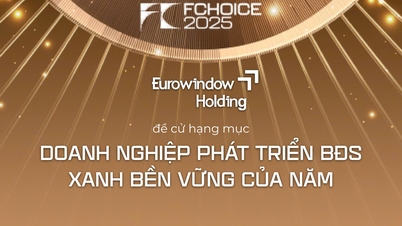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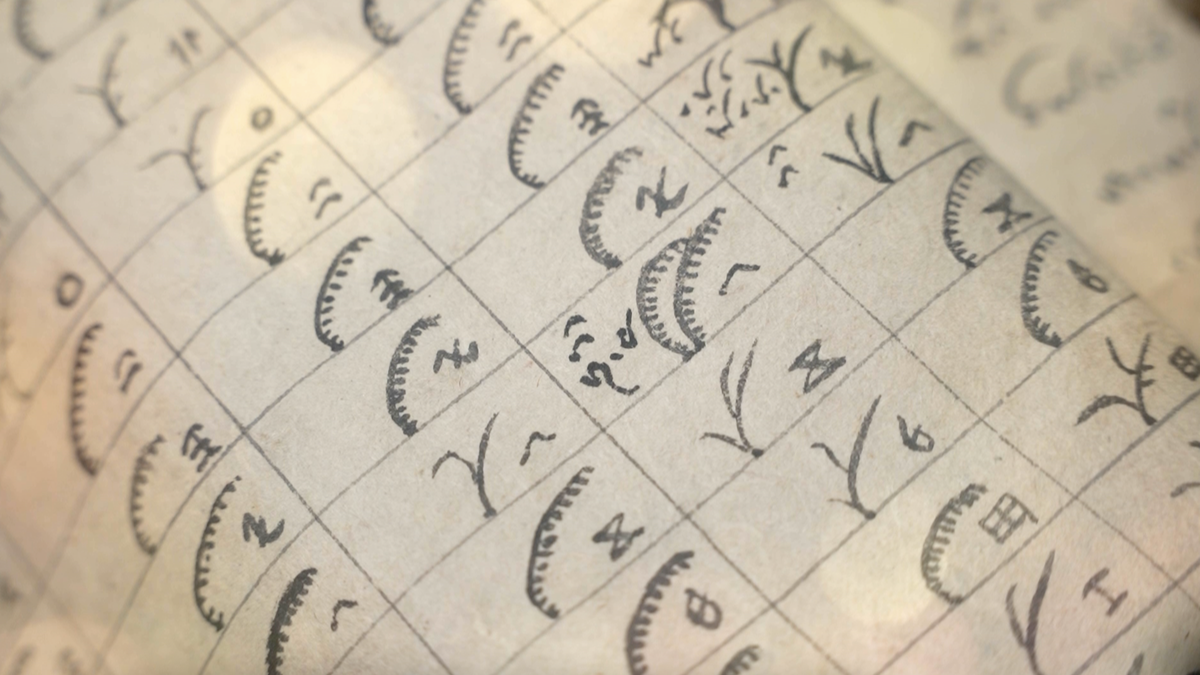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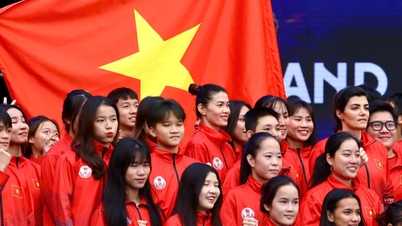
































댓글 (0)